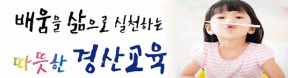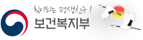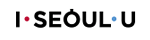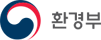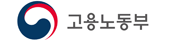- |
- UPDATE : 2026년 02월 15일 일요일
-
강릉
 4℃
4℃
-
경주
 6℃
6℃
-
광주
 7℃
7℃
-
광주
 5℃
5℃
-
군산
 8℃
8℃
-
대구
 6℃
6℃
-
대전
 5℃
5℃
-
마산
 7℃
7℃
-
목포
 7℃
7℃
-
부산
 8℃
8℃
-
삼척
 0℃
0℃
-
서울
 8℃
8℃
-
속초
 8℃
8℃
-
수원
 6℃
6℃
-
순천
 8℃
8℃
-
여수
 7℃
7℃
-
여주
 4℃
4℃
-
원주
 3℃
3℃
-
의정부
 8℃
8℃
-
인천
 6℃
6℃
-
전주
 7℃
7℃
-
제주
 12℃
12℃
-
진주
 7℃
7℃
-
창원
 7℃
7℃
-
천안
 6℃
6℃
-
포항
 6℃
6℃
-
[비평의 뒷면, 해석되지 않는 밤의 기록]

[대중문화평론가/칼럼리스트/이승섭] 필자는 일정 기간 타인의 문장에 밑줄을 긋고, 그 여백에 독설 혹은 찬사를 채워 넣으며 살아왔다. 나의 언어는 언제나 차갑고 명징해야 했으며, 대상의 심장을 정확히 꿰뚫는 ‘언어의 화살’이어야 했다. 평론가라는 문패를 달고 사는 동안, 나는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왜?’라고 물었다. 이 구도는 왜 불안한가, 이 문체는 왜 이토록 서늘한가.
하지만 질문의 끝에서 마주하는 것은 언제나 논리라는 이름의 딱딱한 벽이었다. 정작 나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소중한 것들은 대개 ‘왜’라는 질문 앞에 침묵하는 것들이었음을, 나는 아주 뒤늦게 깨달았다.
서재 깊숙한 곳, 화려한 양장본들 사이에 끼어 있는 빛바랜 노트 한 권을 꺼내 본다. 그 안엔 비평적 문법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투박하기 그지없는 메모들이 적혀 있다. “오늘 엄마가 보내준 김치 상자에서 흙, 냄새가 났다.” “가로등 불빛 아래 흩날리는 눈발이 꼭 누군가의 한숨 같다” 같은 것들이다. 평론가의 눈으로 보자면 이 문장들은 형용사가 과하고 주관이 지나쳐 폐기되어야 마땅한 쓰레기들이다. 그러나 나는 안다. 나의 날 선 비평문들이 세월의 파도에 씻겨 내려갈, 때에도 이 서툰 감각의 조각들은 내 영혼의 가장 깊은 밑바닥에 앙금처럼 남아 나를 살게 했음을 말이다.
언젠가 한 원로 화가의 작업실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그는 평생을 ‘여백’에 매달려온 노장(老長)이었다. 나는 직업적 본능을 발휘해 그의 텅 빈 캔버스 앞에서 ‘공(空)의 미학’이니 ‘존재의 부재’니 하는 화려한 수식어들을 쏟아냈다. 나의 유창한 해설을 가만히 듣던 노화가는 허허 웃으며 낡은 찻잔을 내밀었다.
“평론가 양반, 저 빈 곳에 무엇이 있는지 아나?
저건 내가 그리지 못한 것들이 아니라, 차마 그릴 수 없어서 남겨둔 마음들이라네. 말로 다 하면 향기가 날아가는 법이지.”
그 순간, 나는 내가 휘두르던 언어들이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 절감했다. 나는 대상을 이해한다는 명목하에 그것이 가진 ‘신비’를 난도질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에 억지로 이름을 붙이고, 규정할 수 없는 슬픔에 논리적 인과관계를 부여하는 일. 그것은 어쩌면 대상에 대한 애정이 아니라, 오만일지도 모른다는 서늘한 자각이 뒷덜미를 스쳤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시장 어귀에서 낡은 양은 냄비 그릇 하나를 샀다.
작고하신 할머니가 쓰시던 것과 꼭 닮은, 금방이라도 찌그러질 듯 얇고 가벼운 냄비였다. 할머니는 그 냄비에 미군이 준 딱딱한 우유를 데워주시며 늘 말씀하셨다. “음식은 손맛이 아니라 마음 맛으로 묵는 거다.” 그 시절, 할머니의 우유는 늘 그때 그 당시 제일 단백질이 많은 음식이었으며 제일 맛난 우유였기에 잊을 수가 없다. `
평론가의 잣대로는 결코 ‘맛집’의 반열에 오를 수 없는 맛이었다. 하지만 그 투박한 양은 냄비 안에는 손자의 허기를 채워주고 싶어 안달 난 한 노인의 지극한 생애가 끓고 있었다. 그것은 해석의 영역이 아니라 체험의 영역이었으며, 비평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이었다.
이제 필자는 글을 쓸 때 조금 더 자주 멈춘다. 문장과 문장 사이에 일부러 빈틈을 낸다. 독자가 그 틈새에 자신의 기억을 채워 넣기를, 나의 마침표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물음표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비평은 대상을 ‘정의(定義)’하는 일이지만, 수필은 대상을 ‘기억(記憶)’하는 일이다. 나는 이제 차가운 해부학자의 가운을 벗고, 온기 있는 관찰자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싶다.
인생은 결코 한 편의 완벽한 논문이 될 수 없다. 그것은 오히려 수많은 오타와 비문(非文), 그리고 차마 다 쓰지 못한 채 얼룩진 눈물 자국들로 가득한 비망록에 가깝다. 나는 그 무질서한 생의 기록을 이제는 사랑하려 한다. 이유 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지 않고,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을 억지로 분석하지 않으려 한다.
어느덧 창밖의 어둠이 짙어졌다. 책상 위 스탠드 불빛이 닿지 않는 어둠의 끝자락을 바라본다. 저 어둠 속에는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해석되지 않는 마음’들이 숨을 죽이고 있을 것이다. 나는 오늘 밤, 비평가로서의 예리한 펜촉을 내려놓고 투박한 연필 한 자루를 쥐어본다. 그리고 종이 위에 조심스럽게 적어본다.
“그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시린 봄날이었다.”
이 문장에는 근거도, 논리도 없다. 하지만, 이 비논리적인 문장이 주는 아릿한 여운이야말로 내가 평생 찾아 헤매던 진실에 가장 가깝다는 것을, 필자는 이제야 알 것 같다. 해석되지 않아도 괜찮다. 아니, 해석되지 않기에 인생은 이토록 눈부시고 애틋한 것이기에-
2026. 02.
-오랜만에 에세이를 쓰면서-
대중문화평론가/ 칼럼리스트 이승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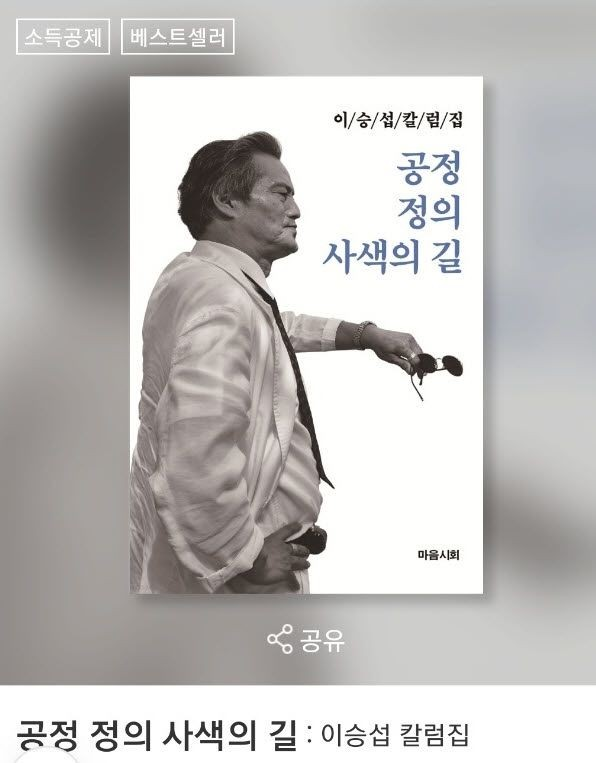
[필자의 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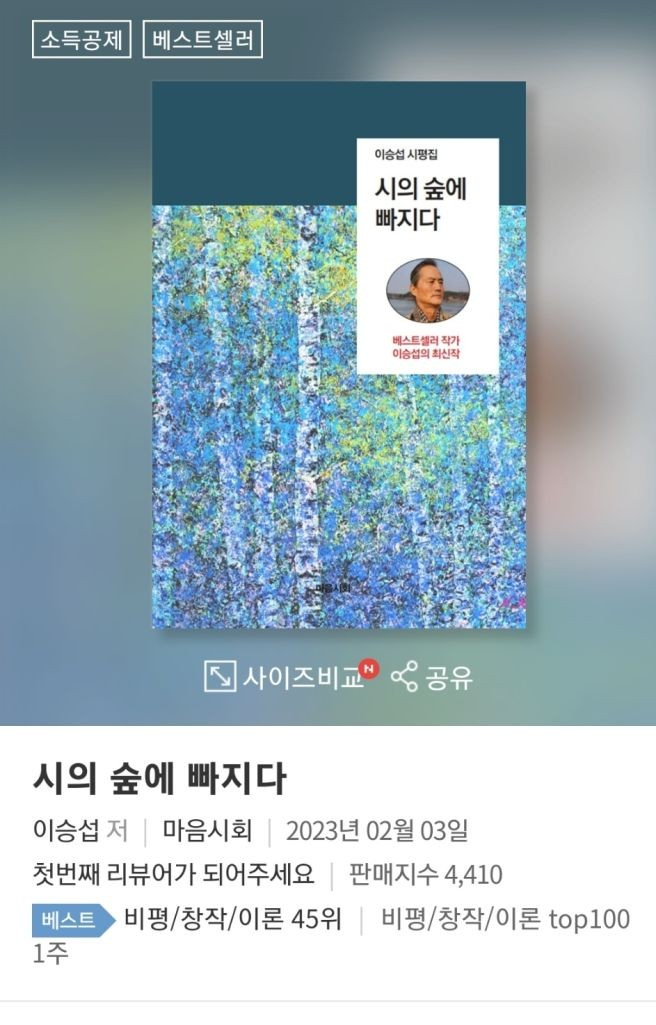
[필자의 저서]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피니언
1[비평의 뒷면, 해석되지 않는 밤의 기록] 2[새로나온 책] 세상을 기록하던 사람에서 바꾸는 사람으로 3용인중앙직업전문학교 김진범 경영지원본부장의, 2026. 지게차운전기능사, 산업 물류의 핵심 인재 양성 4팝아트 스텔라김작가, 행복의 온기 나누는 '달콤함이 몰려오는 날들'展 5서릿발 칼날 위에 선 행정통합, 희망의 봄으로 갈 수 있는가 6온 아트스페이스 기획, 서양화가 민율작가 휴식과 위로 전하는 '나무의자 바람에 기대어展' 7팝아트 스텔라김 작가, 삶의 위로 전하는 '색으로 숨 쉬다(Breathing in Color)' 개인전 8[새로 나온 책] 블러드 머니 9반도체클러스터, 왜 이천이어야 하는가. 10서양화가 황제성 작가, 어린왕자와 피노키오로 보는 어른들의 동화 'Nomad-Idea' 개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