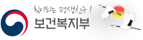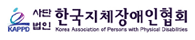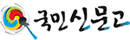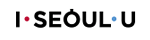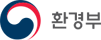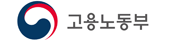- |
- UPDATE : 2026년 01월 09일 금요일
-
강릉
 4℃
4℃
-
경주
 6℃
6℃
-
광주
 7℃
7℃
-
광주
 5℃
5℃
-
군산
 8℃
8℃
-
대구
 6℃
6℃
-
대전
 5℃
5℃
-
마산
 7℃
7℃
-
목포
 7℃
7℃
-
부산
 8℃
8℃
-
삼척
 0℃
0℃
-
서울
 8℃
8℃
-
속초
 8℃
8℃
-
수원
 6℃
6℃
-
순천
 8℃
8℃
-
여수
 7℃
7℃
-
여주
 4℃
4℃
-
원주
 3℃
3℃
-
의정부
 8℃
8℃
-
인천
 6℃
6℃
-
전주
 7℃
7℃
-
제주
 12℃
12℃
-
진주
 7℃
7℃
-
창원
 7℃
7℃
-
천안
 6℃
6℃
-
포항
 6℃
6℃
-
[상상의 결합과 서정의 조화]

[대중문화평론가/칼럼리스트/ 이승섭시인] 시가 무엇인지 물어보면 이미 시는 이미 달아나 혼비백산(魂飛魄散)한다.
그렇다고 시가 무엇인지 묻지 않으면 다시 시는 미궁의 깊이에서 서성이는 이름으로 나를 불러낸다. 시는 늘 살아있고 생명의 호흡을 날마다 호소하지만 사람은 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따라 시의 표정은 각기 달라지며 감성과 정서가 많은 시인에게 가면 다른 표정과 언어로 태어나곤 한다. 그렇다면 시는 불변의 진리를 말하는 스피커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서 가장 진솔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자락 펼칠 때, 세상을 향하여 진리에 대한 표정을 관리한다.
그렇다고 시는 진리만을 강조하는 교훈이 아니라 인간의 애환에 대한 조언을 멈출 것을, 암시하지도 않는다. 때로는 삶의 전면에서 용감한 투사의 호기를 부리기도 하고 더러는 아픔을 위로하는 진정성의 말에 가슴을 치기도 한다. 결국 시는 삶의 곁에 있을 때, 시의 역할과 유용한 임무를 다한다.
한 사람에 시인의 시집은 앞에서 말함과 같이 인간이 만드는 표정의 전부를 시적으로 나타내는 기교이고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는 독자 감수성의 정도에 따라 시의 등급은 길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시적 작품이 탄생에서 명품은 없다. 오로지 스스로가 만드는 여부에 따른 이름이 명품일 뿐이다.
왜 그런가 하니 누가 명칭을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명품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길이 만들어진다는 뜻이다. 2번째 시집을 출간한 홍금선 시인은 여린 감수성과 순수한 정서의 숲이 지고지순하다.
그의 시를 보면 싱그럽고 집약성의 언어가 맛깔스럽다. 자유시와 정형시를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자유스러운 정서의 나열이 시가 될 수도 있고 정형의 일정한 형식에 내용을 담는 방법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시라는 범주 안에서는 굳이 구분의 칸막이가 필요치 않다는 말이다.
문제는 독자가 읽어 감동, 받을 수 있다면 어떤 것이든 시의 맛은 화려한 감동이기 때문이다.
2. 숲의 향기는 어디서 오는가
1) 정서의 특질
시의 구성은 시인의 정서가 이미지로 형상화할 때, 이미지의 구축에는 설계로의 얼개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시인의 의도가 진로를 찾아가는 것이다. 이때 한 편의 시는 시인 자신의 표정이고 사상을 나타내는 시인 정신에 집약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시는 곧 응축이라는 언어의 절약과 그 탄력으로 튕겨 오르는 리듬의 연주가 되는 것이다. 이것저것 섞어서 만드는 잡다한 것이 아니라 정제되고 질서 있는 풍경화 혹은 치밀한 구도 속에 언어의 탄력이 튕겨 이미지의 숲을 만들어야 한다면 홍금선의 시는 그런 욕구에 적절히 부응하는 시가 숲을 푸르게 하고 있다.
가볍게 주섬주섬
온기로 녹이는 마음
빈, 공간 그득히
반질반질 후원하게 `
돌아보며 빙그레 닦아 보는 너
<마음> 중
원래 시의 특질을 토운(tone)이라고 말한다. 여기에는 시적 장치와 특징을 모두 담아서 말하는 총체적인 의미를 말한다.
왜냐하면 단편적인 특징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어조, 소리, 음조, 신호 등으로 해석되지만 시에서는 부드럽다거나 아니면 딱딱하냐, 혹은 냉정한가 또는 직선적인가 등을 의미하면서 한 가지 방향으로 지칭하지 않는다. I. A Richards는 의미와 감정, 의도와 더불어 시의 총체적인 의미라 했고, 르네 웨렉과 윔셑은 “내적 형식”이라는 말로 구분했으니, 한 가지로 특징을 요약하는 것은 무의미하지만, 시의 총체적인 것을 말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는 시의 “목소리” 즉 화자의 목소리를 의미할 때 곧 화자의 어떤 특성이 나타나는가의 문제를 지칭하는 것이라 달리도 말한다. “마음”을 나타내는 방법은 산문적인 장광설도 있고 또 단순하면서 명쾌한 선적(禪寂)인 고요한 방법이 있다면 홍금선의 정서는 후자에서 그의 시적 특성이 집약된다. 시의 중심 언어는 “마음”이다 “가볍게”와 “주섬주섬”을 모아 “빈, 공간을 그득히” 더불어 “반질반질”과 “훠언하게”의 결합에서 어둠이 없고, 밝고 환한 경치가 눈앞에 펼쳐진다.
“빙그레”의 표정에서 시인의 정신이 있어 밝고 투명하고 구김살 없는 정서의 유로(流路)가 아름다움을 남긴다. <마음> 시는 도합 40글자로 되어 있지만 구성된 이미지는 여러 개의 갈래로 파생되는 기교는 시인의 시적 능력을 뜻한다. 이런 특징을 강조한 이유가 함축된다.
하늘을 보노라면 발그레한 노을
물결로 일렁이고
파랑, 파랑 자죽자죽 여울지는 길을 따라
두런두런 하늘 붉은빛 원을 그린
먼 곳 머물고 싶은 마음속 풍경화
<노을 길> 중
시란 시인의 마음을 그림으로 그리는 풍경화 -
이때 시의 특성 중에 회화 즉 (phanopoeia)를 대입할 수 있을 것이다.
시를 읽어 그림을 연상하는 일은 의미와 리듬과 3대 요소라는 점에서 필수적인 이미지 구축술이다.
“노을이 물결로 일렁이는” 연상은 고요와 더불어 따라오는 소리의 겹침이 연상 작용으로 이어진다. 또한 <노을 길>의 가장 백미이다. “파랑파랑”과 “자죽자죽”에서 언어의 특징이 한몫으로 드러난다. 이런 언어의 감수성을 터득한 시인의 시적 능력은 감각적인 언어의 탄력을 싱그러움으로 살아나게 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다.
흔히 서정시의 특징을 말하면 자아의 세계와 일체화를 이룩하는 방법론과 주관이나 객관 또는 이성과 감정이 하나로 통합되는 서정적인 자아의 확립을 motto로 나아가는 정서에는 유연한 감성이 파도를 일렁이게 만들어 논을 하는 필자도 기분이 절로 좋아진다.
<낙엽> <단비> 풍경> 등 다양한 시가 많지만, 그것을 모두 논한다면 양이 너무 많아 간단하게 그의 주요 부분만 언급하였다. 다만 시는 절망과 아픔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길이라고 늘 말을 하지만 그러나 시는 아무런 힘도 없고 명예도 아닐 것이지만 아픔이나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한 편의 시는 용기와 희망을 주는 에너지이기에 더욱 위대한 힘을 가진다는 뜻이다.
시는 그렇기에 문학이라는 맨 앞자리에 놓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반인은 모르고 지나가는 일이지만 시인은 그것을 낚아채는 것이 시인이다. 무심히 지나가는 담쟁이넝쿨의 모습에서 삶의 길과 운명을 개척해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는 것도 시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독자가 시 1편을 보고 느끼는 희망의 담금질을 하는 행위와 표현에서 악착한 삶의 길을 펼쳐야 하는 이유와 기운을 받는 것도 독자의 몫인 것 -
시를 이해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행운이라는 뜻이다.
3. 에필로그- 독특한 상상의 표현 압축
시인의 시적 언어 감각은 탁월한 것 같다. 특히 서정성의 부드러움과 자아의 대상을 독특한 언어로서 조화를 이끌면서 풍경화를 그리는 섬세함과 솜씨는 일품이라고 장담한다. 더구나 언어의 직조에 번지는 묘미와 응축을 통해 이를 탄력으로 이어지는 상상의 길은 그만의 성을 구축하는 구상이면서 특징이라 하겠다.
이번 2번째 시집을 출간하면서 꾸준한 열성으로 이어진다면 우리 시단의 돌풍과 더불어 무서운 기둥 역할을 할 것이라고 느끼면서 나가려 한다. 앞으로 두고두고 볼일이 아닐까 하면서 말이다.
2025. 08.
대중문화평론가/칼럼니스트/이승섭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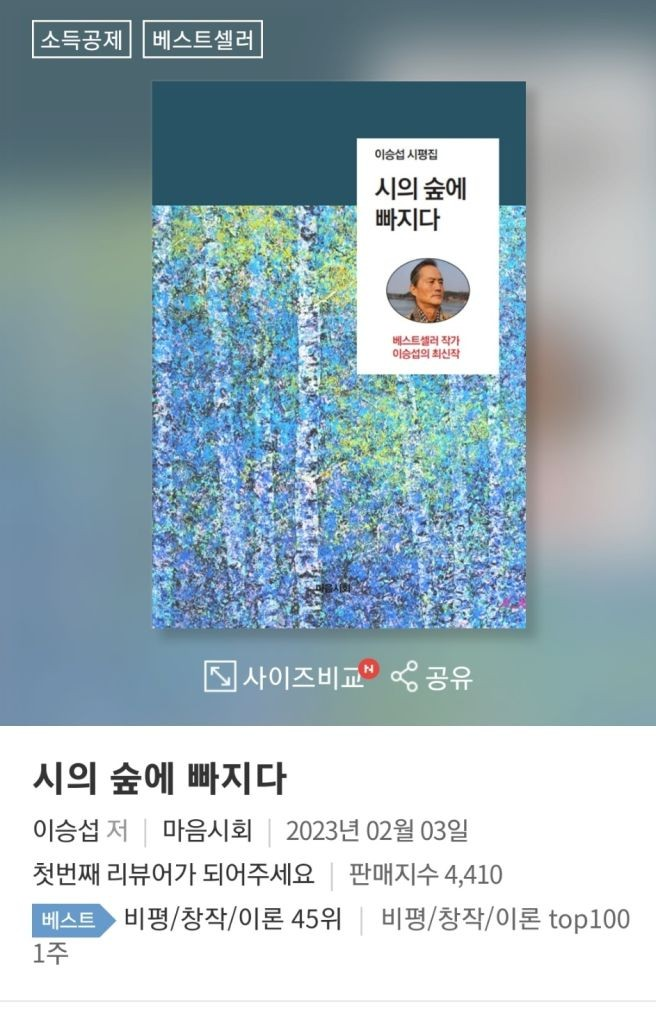
[필자 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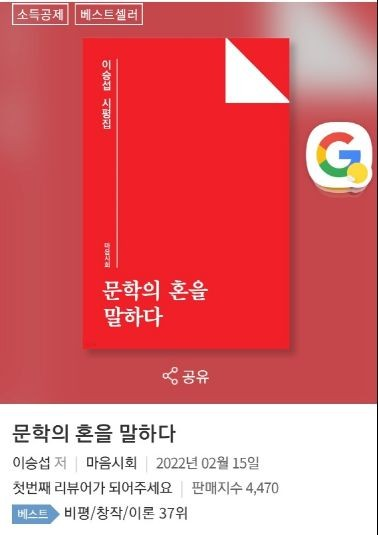
[필자 저서]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피니언
1아트인동산, 전속작가 6人의 작품으로 'LA Art Show 2026' 참가 2[문학적 평행이론의 구조적 매커니즘과 서사적 기능이란?] 3신간도서 슈퍼 체인지, 리플혁명과 약탈경제 그리고 대공황의 덫 경고 메시지 4서양화가 윤종 작가, 감성적 풍경 '우리들의 하양 겨울이야기' 개인전 5[신간] 낯선 땅에서 낮아진 마음… 라오스 풍경 담긴 신현수 8번째 시집 6[대상과 조정 거리의 미학] 72026년 병오년(丙午年) ‘말의 해’, 말의 민속적 상징성은? 8<경기도교육청> 수원 남수원중학교, 학생의 이야기가 책이 되다 9자개회화로 K-아트 알리는 '2025 생활나전공예협회 정기전' 성료 10(사)종합유성문예에서 선정한 2026년 대한민국을 빛낼 60 인의 선정